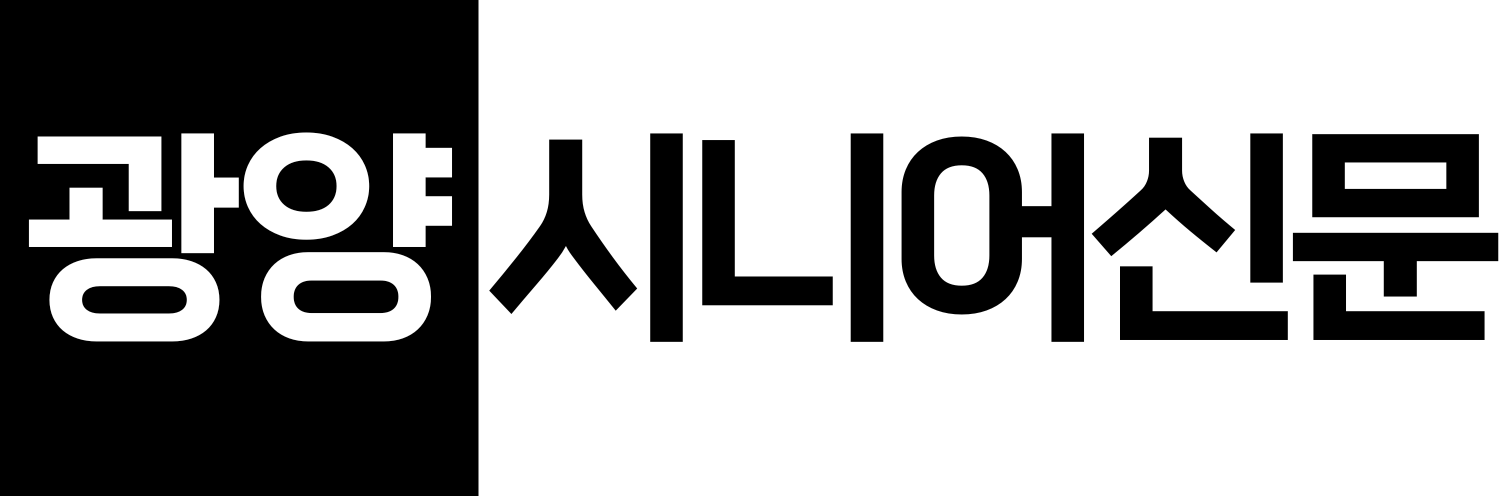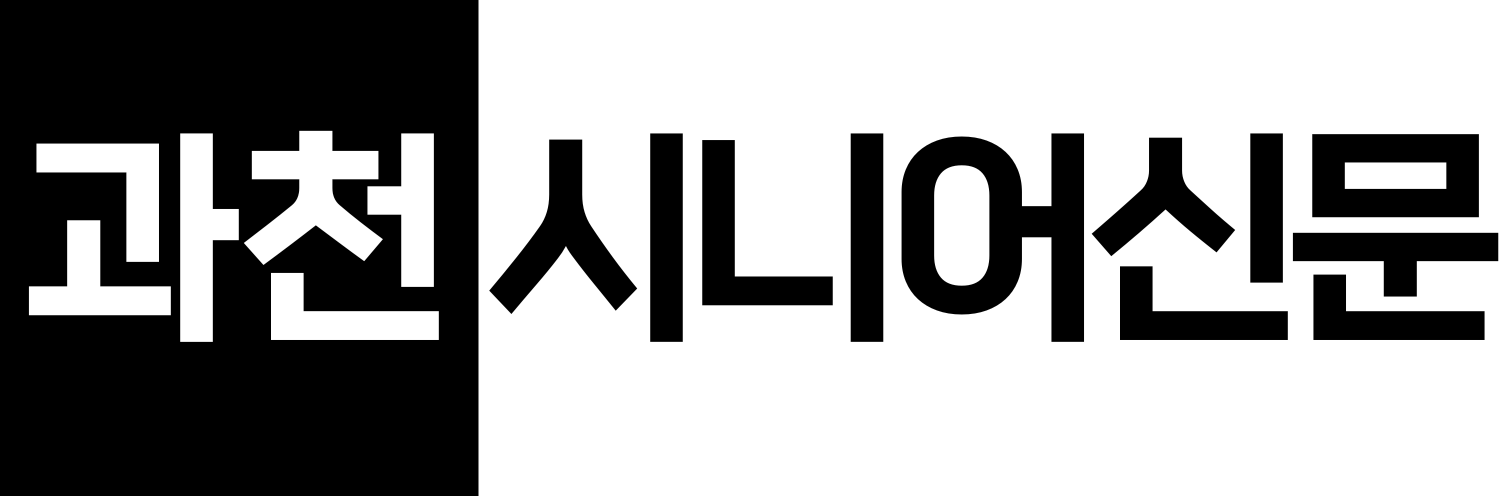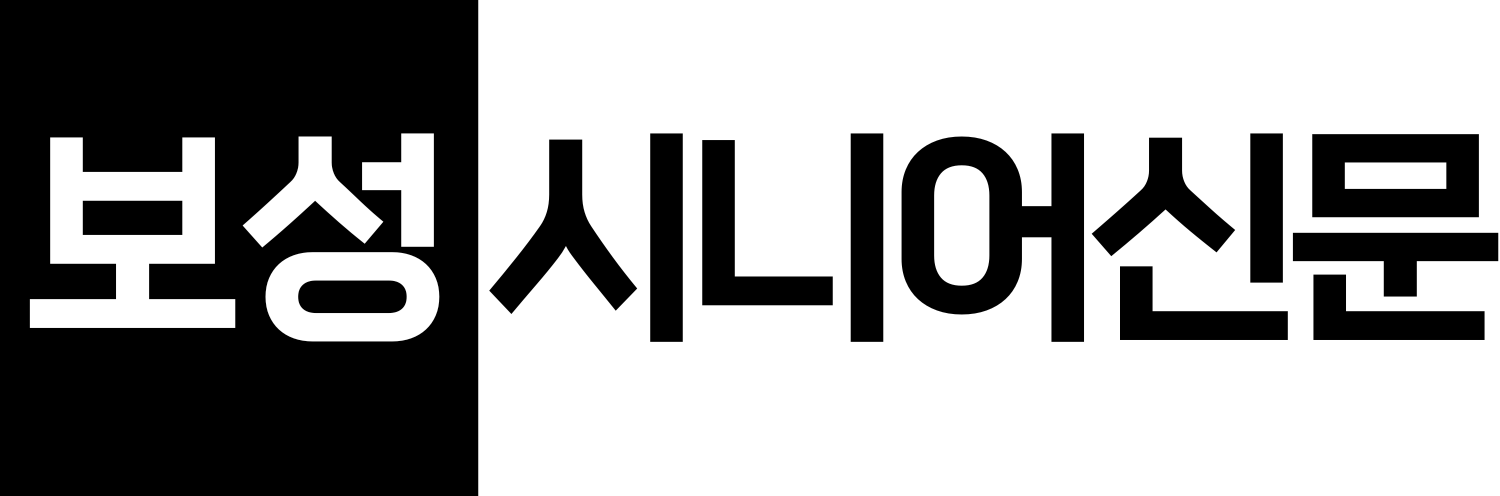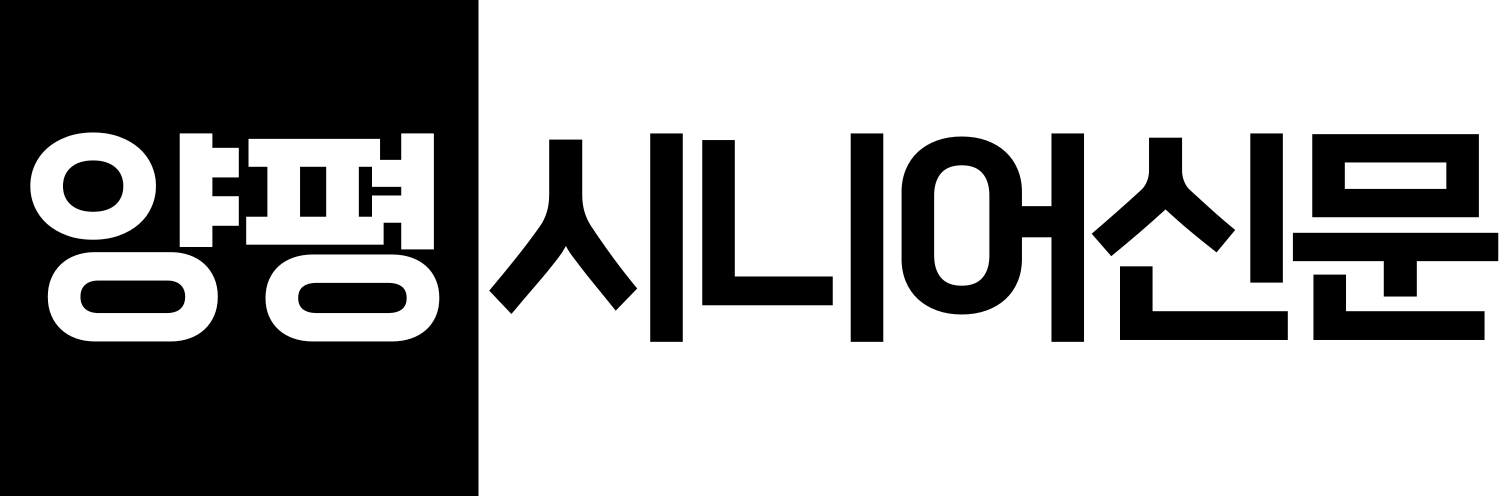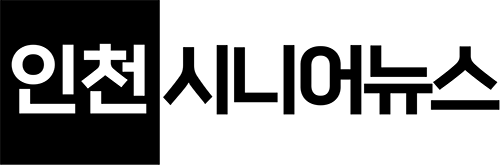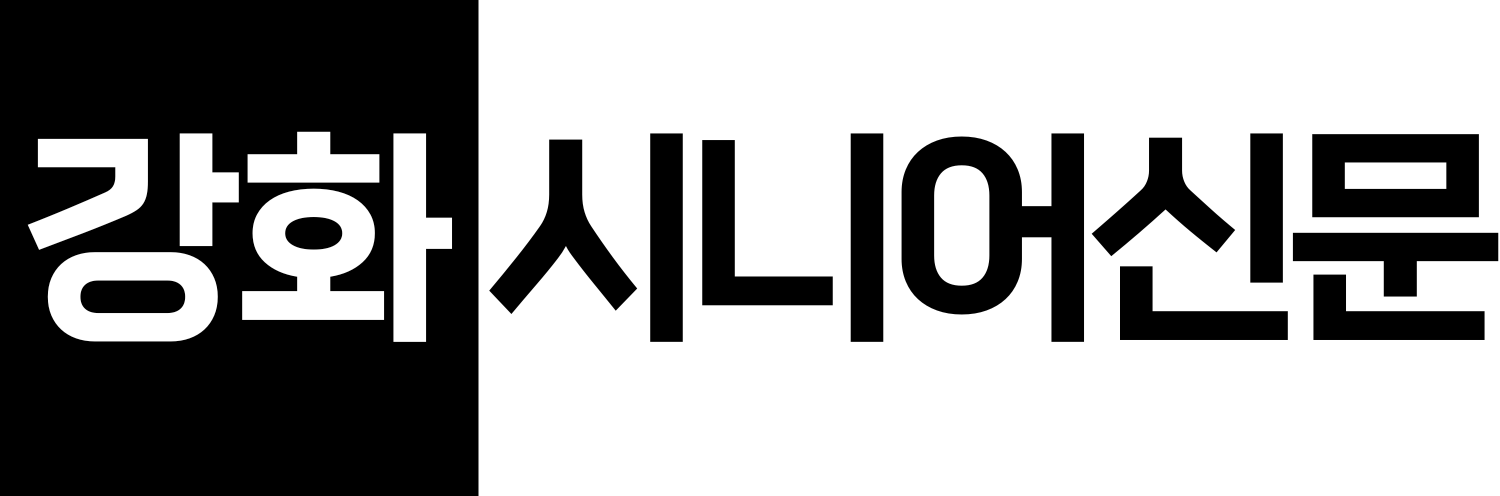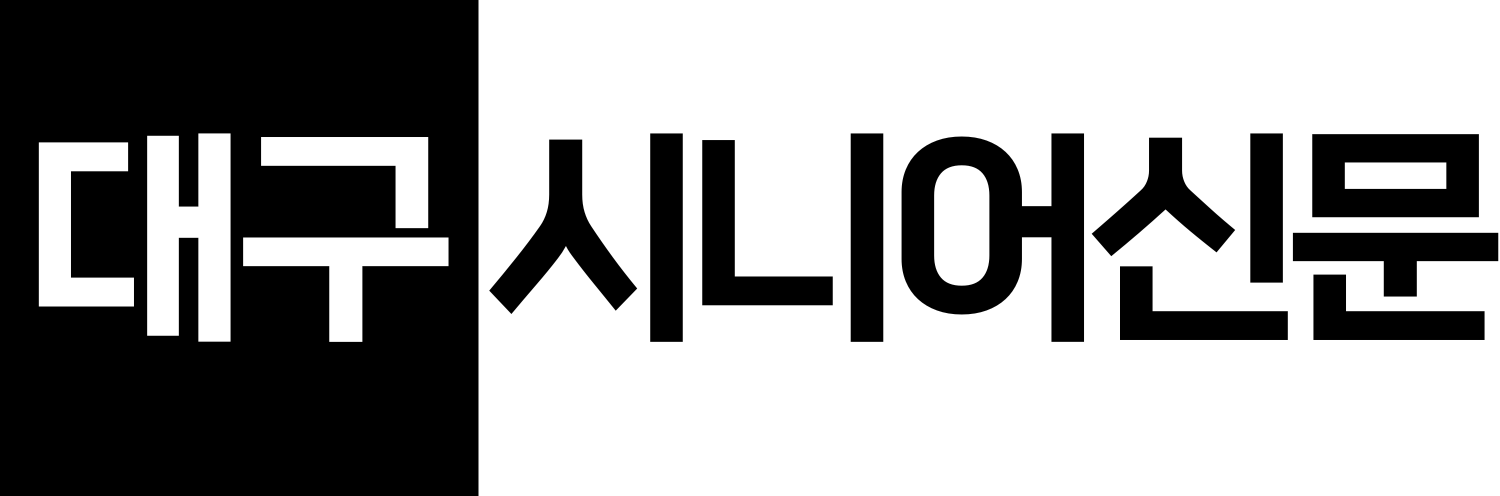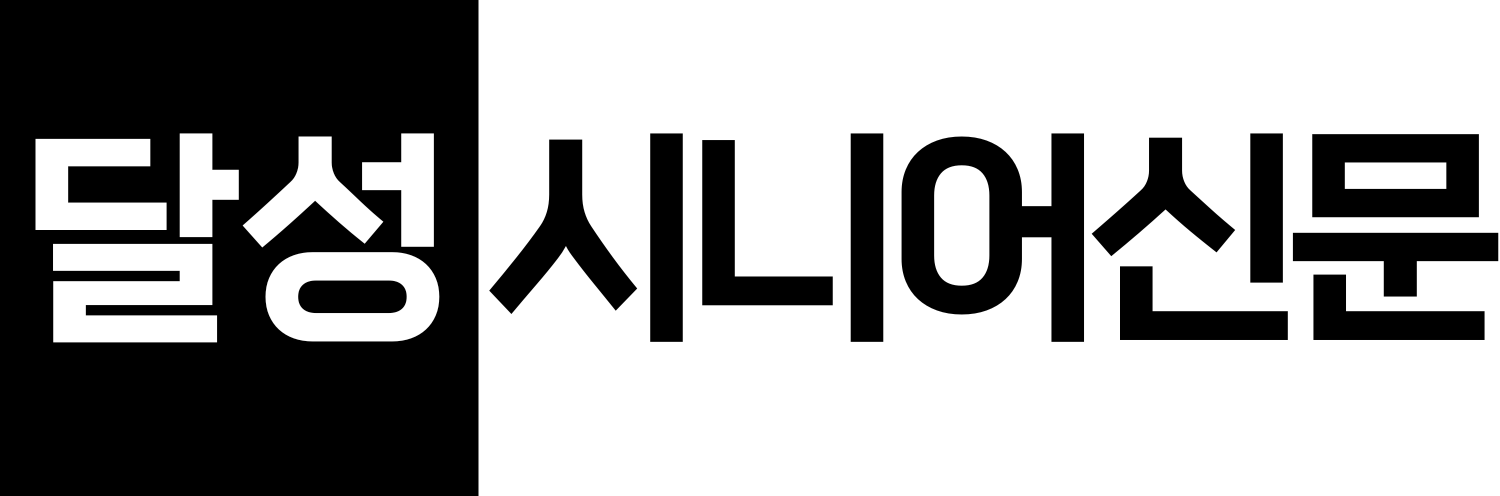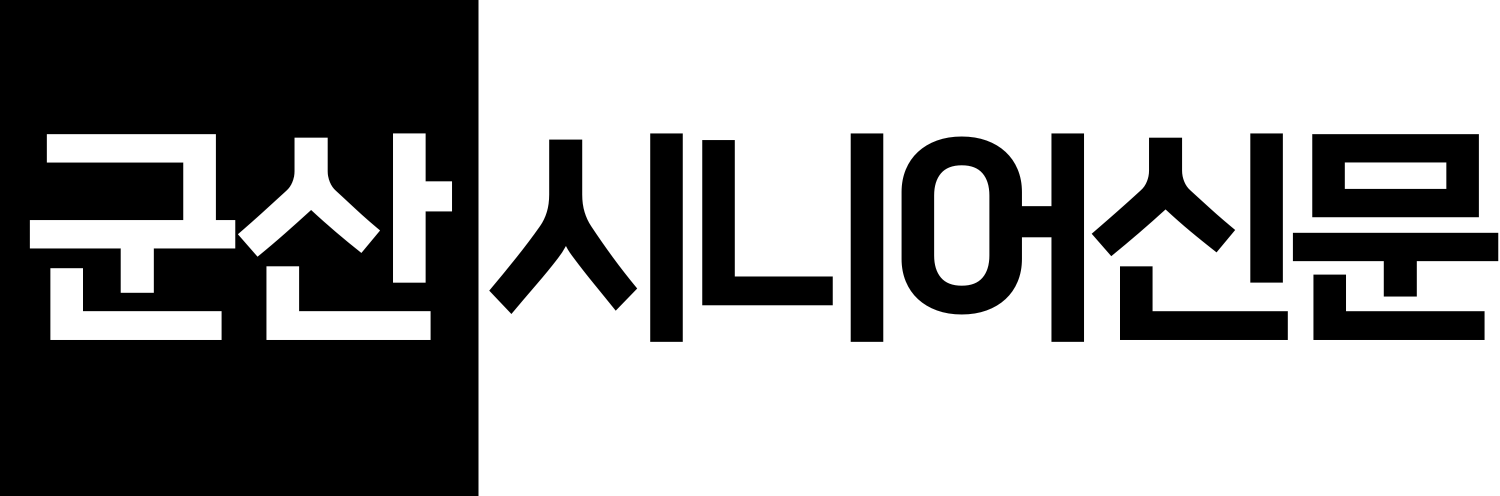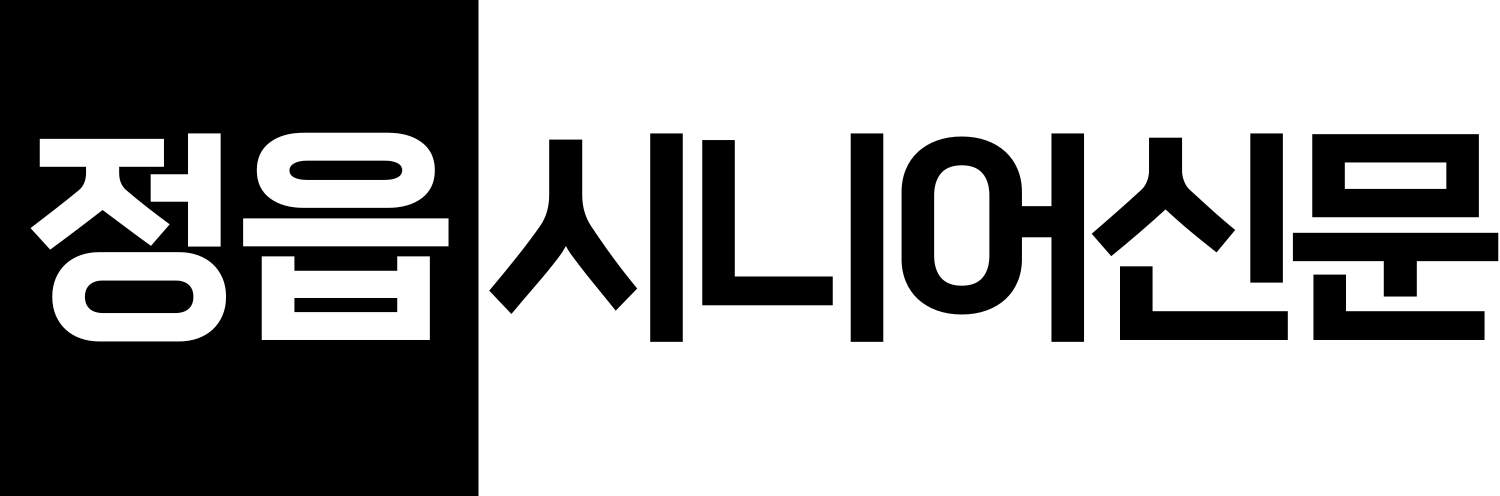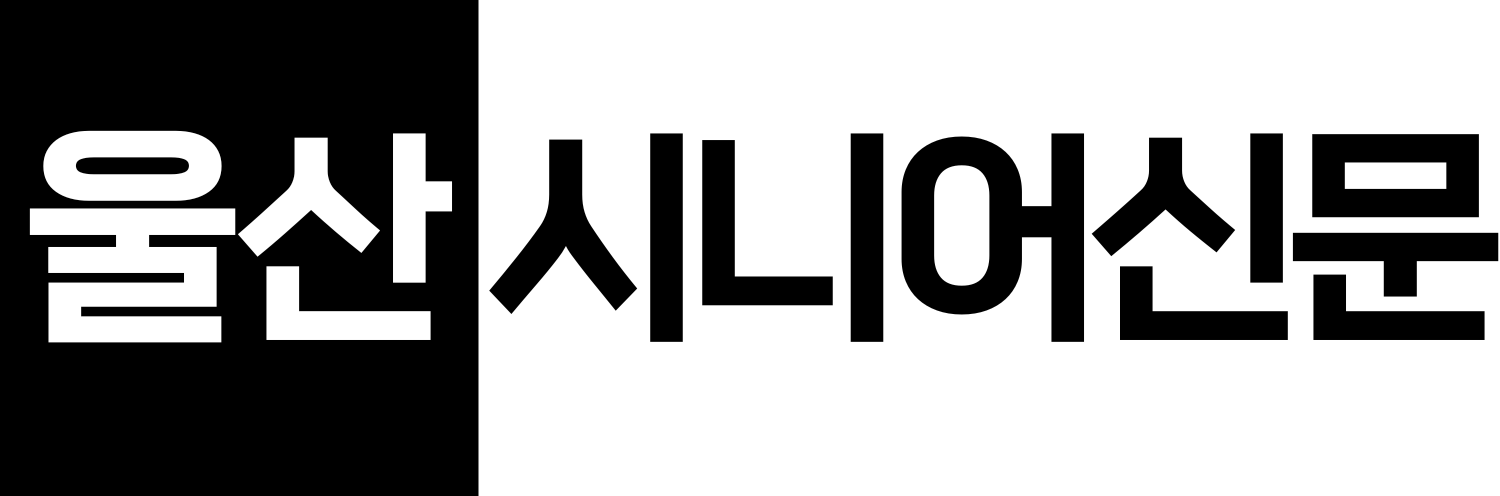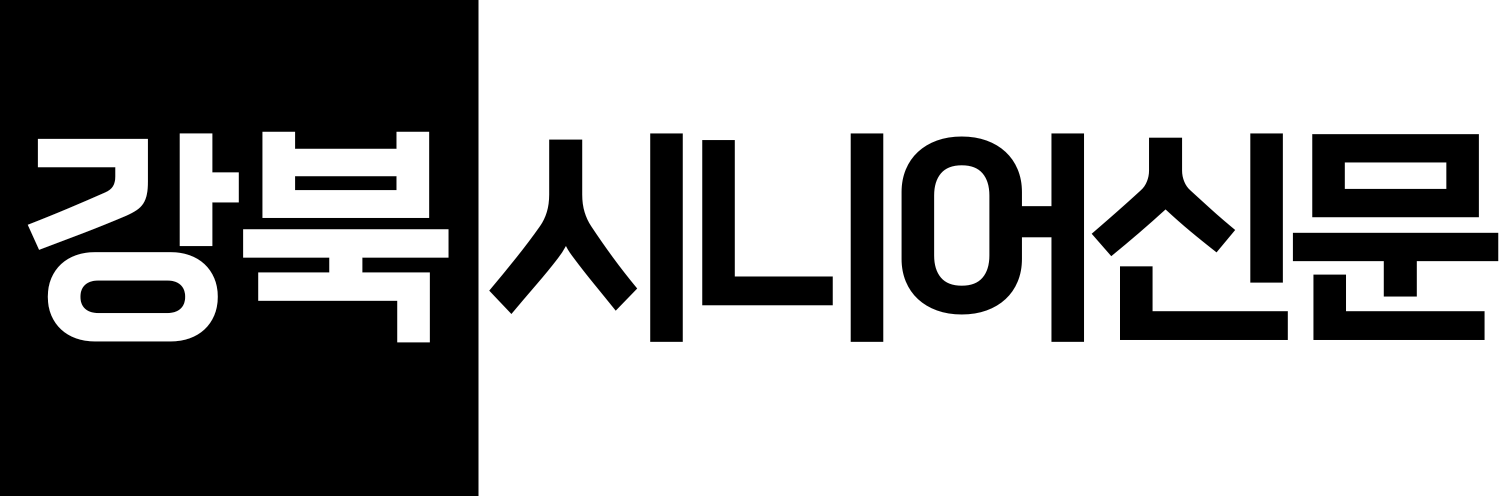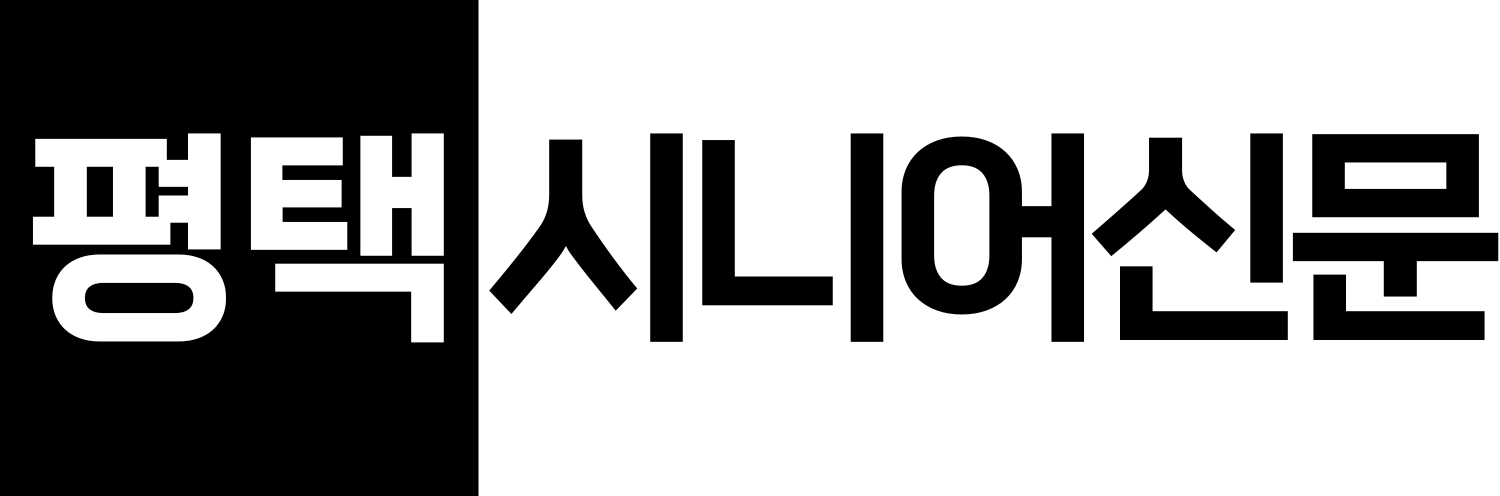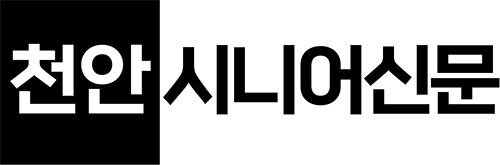백일도 채 안 된 생명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온 날을 생각한다.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아기방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설렘과 떨림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이 따스한 존재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았을까.
손녀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고, 울음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다. 손짓 하나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다. 아마도 그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내 손을 잡으며, 나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어느새 동화 작가가 되어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아장아장,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내딛었다. 그때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다.
나무 그네에 앉아 있던 모습, 빨간 앵두를 처음 맛보고는 새콤함에 얼굴을 찡그리던 표정.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행복의 미소는 지금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세상의 맛을 알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는 커다란 모험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사랑이라는 양분을 조금씩 더 많이 주고 싶어 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새싹처럼, 아이는 정말로 매일 조금씩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웃음소리가 더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더 단단해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더 반짝거렸다.
성장에는 아픔도 따랐다. 갑작스럽게 아파 응급실에 가야 했던 날들, 부상을 당했을 때마다 나이 든 조부모로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다. 우리 모두 분리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애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다. 할머니가 다시 서울로 향했을 때 보여준 그 환한 미소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따스하게 자리하고 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아홉 살 어린 숙녀가 되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그 아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작은 축제가 된다.
작은 손을 잡고 샤워장으로 향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 제 친구 중에 할머니가 안 계신 애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소리 사이로 들려온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아이를 걱정하듯, 이제는 아이가 나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아이의 바람처럼,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기를 나도 소망한다.
햇살 같은 아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태양. 사랑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따스함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이구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추억들이 한 편의 시가 되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써나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