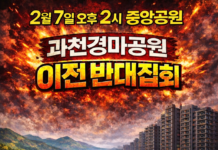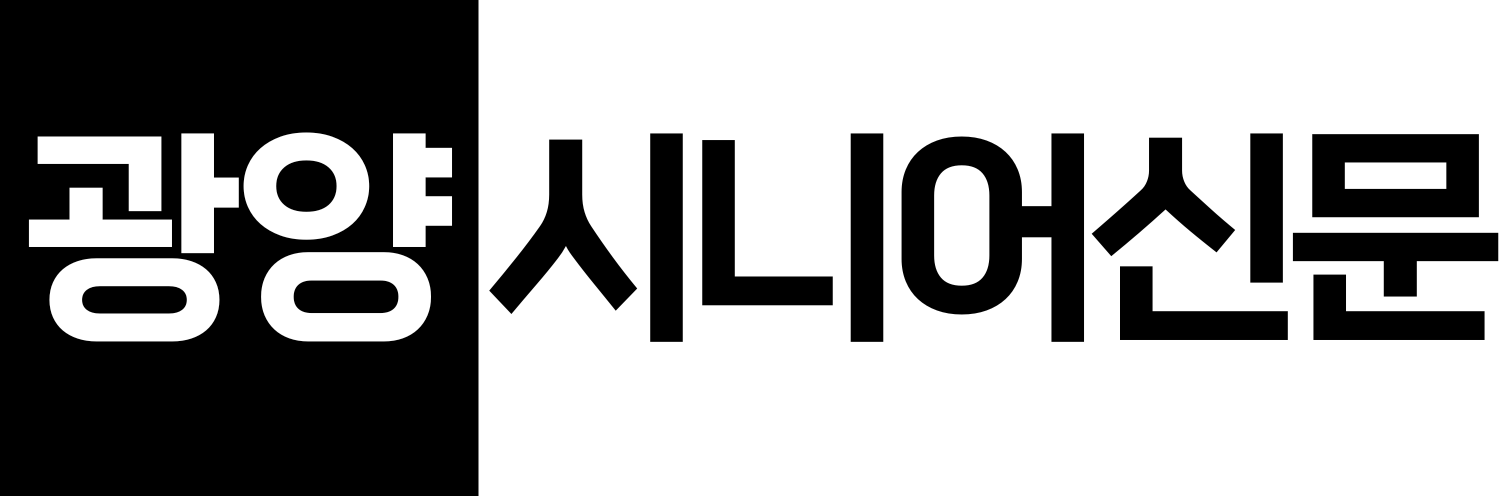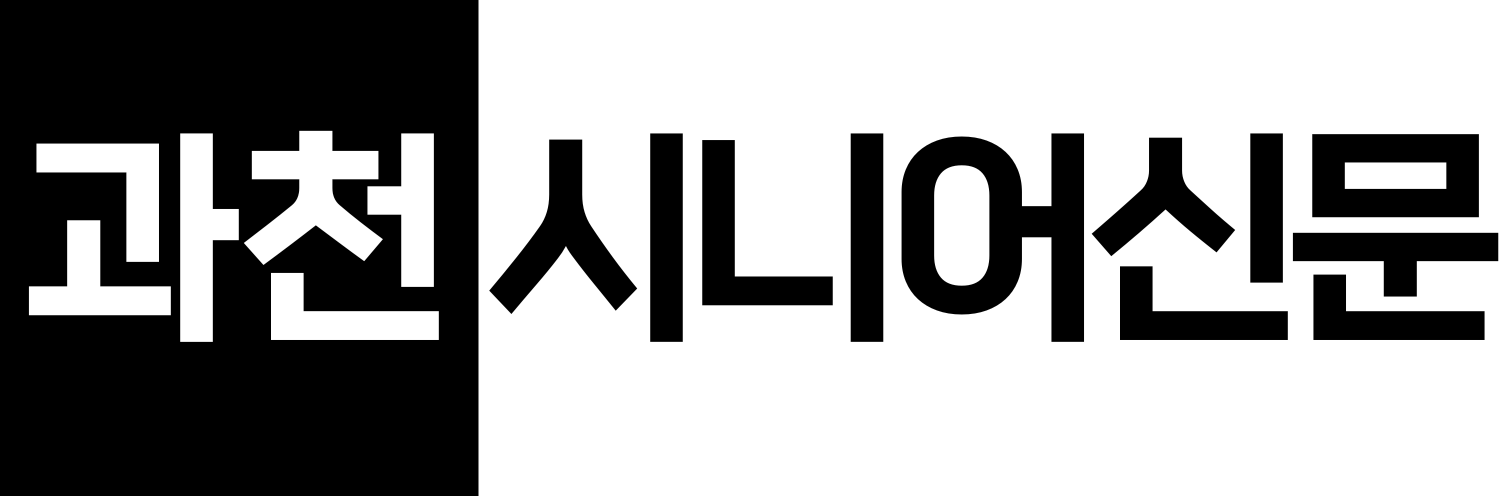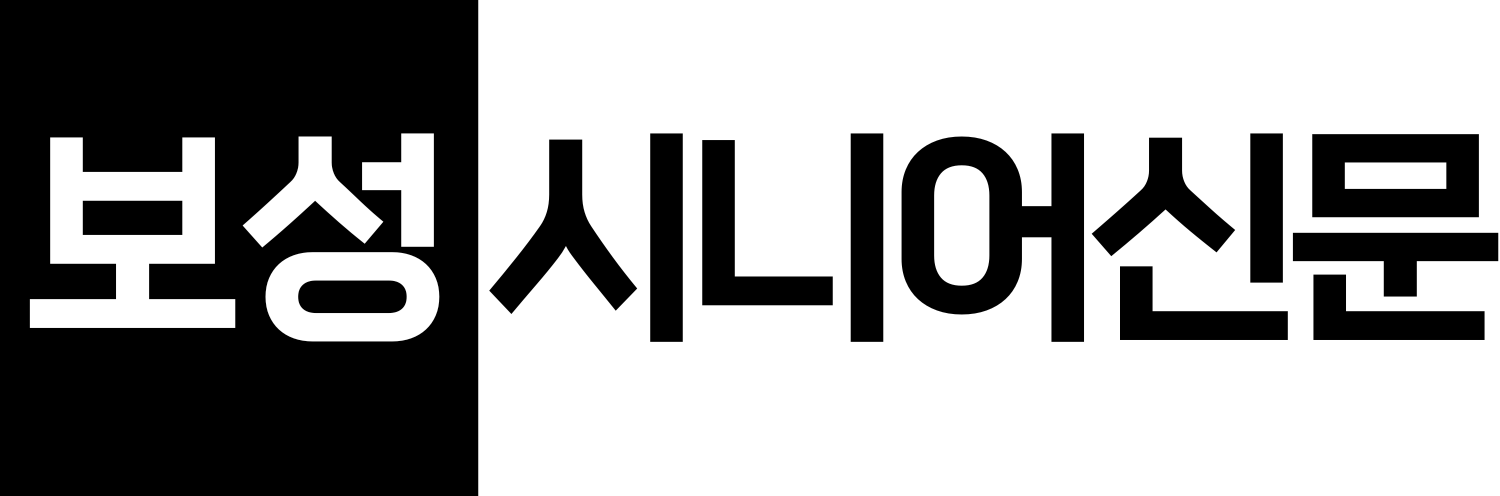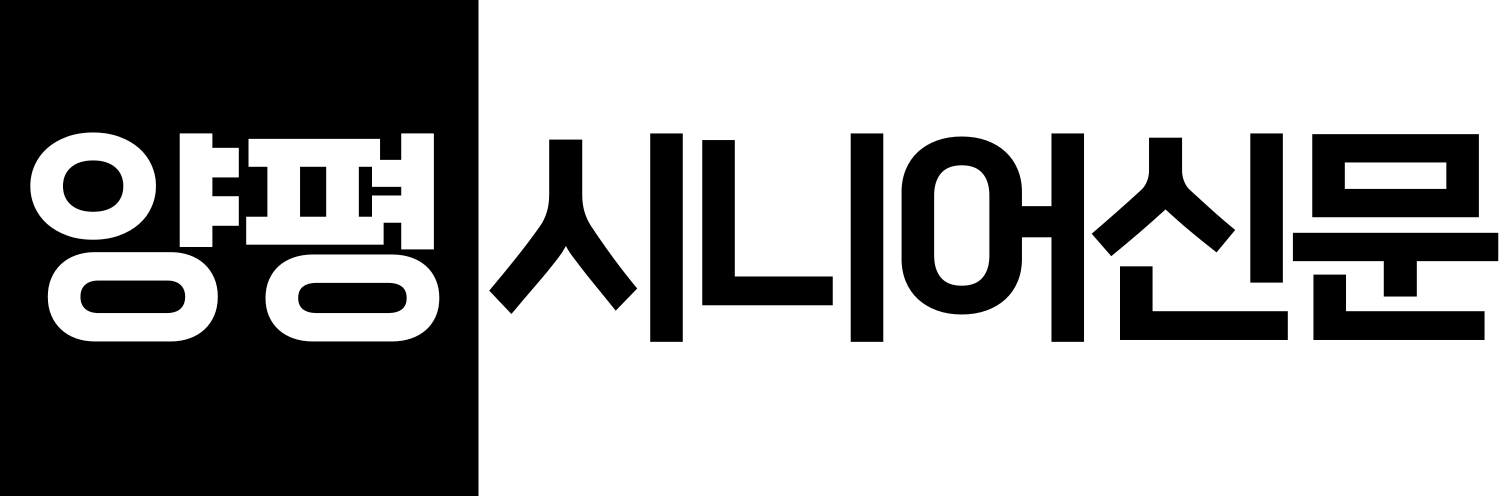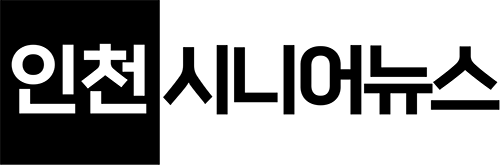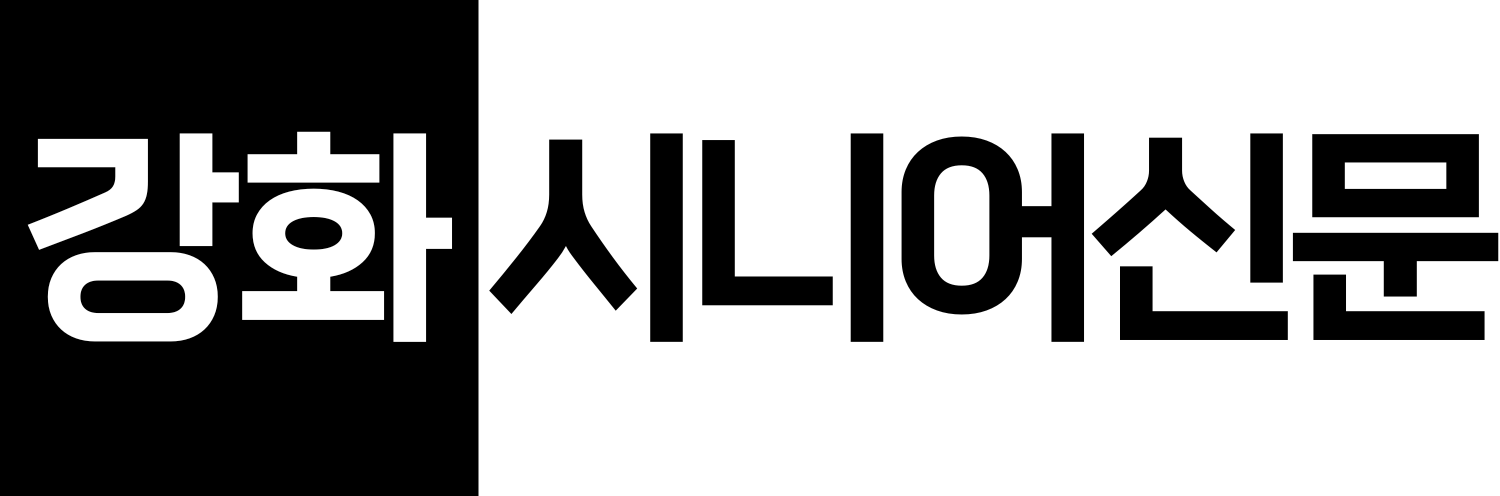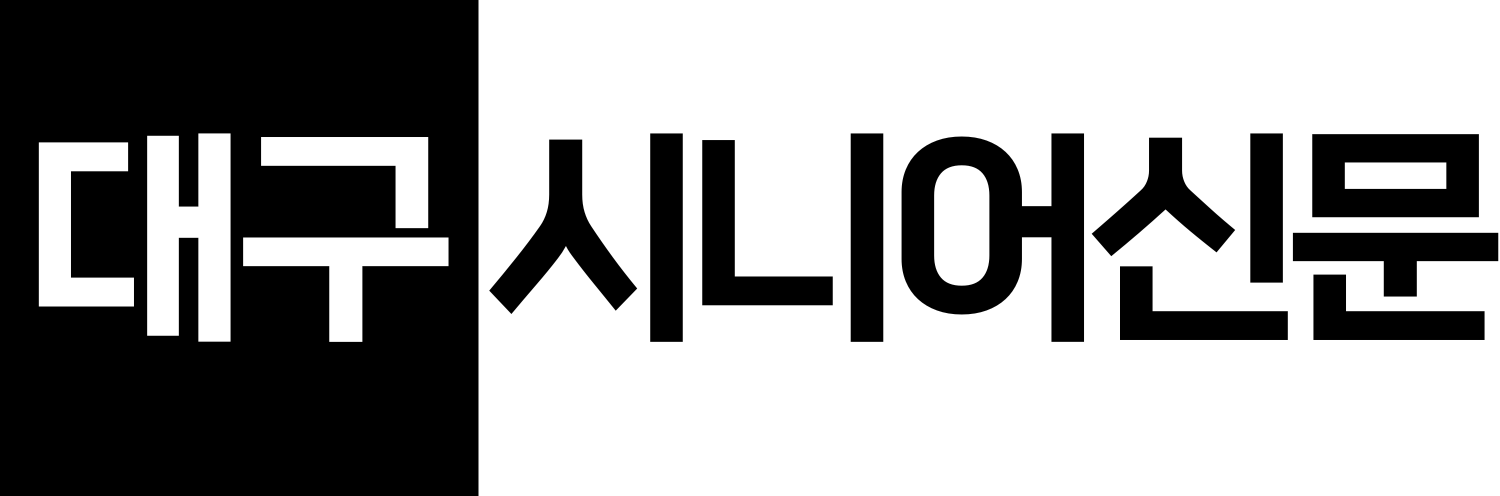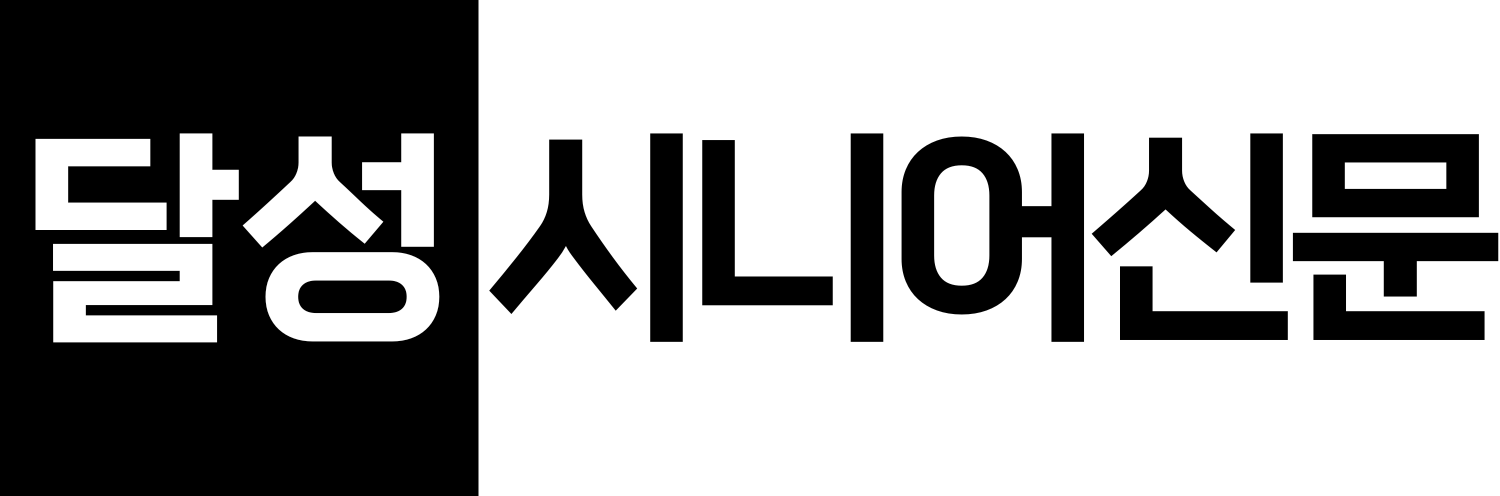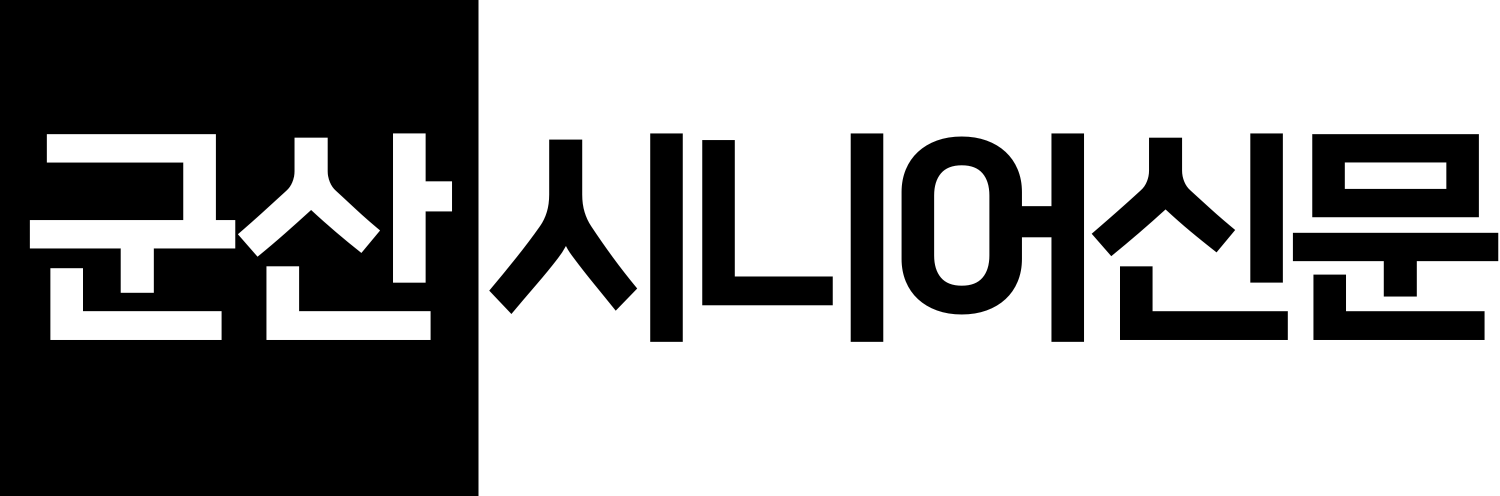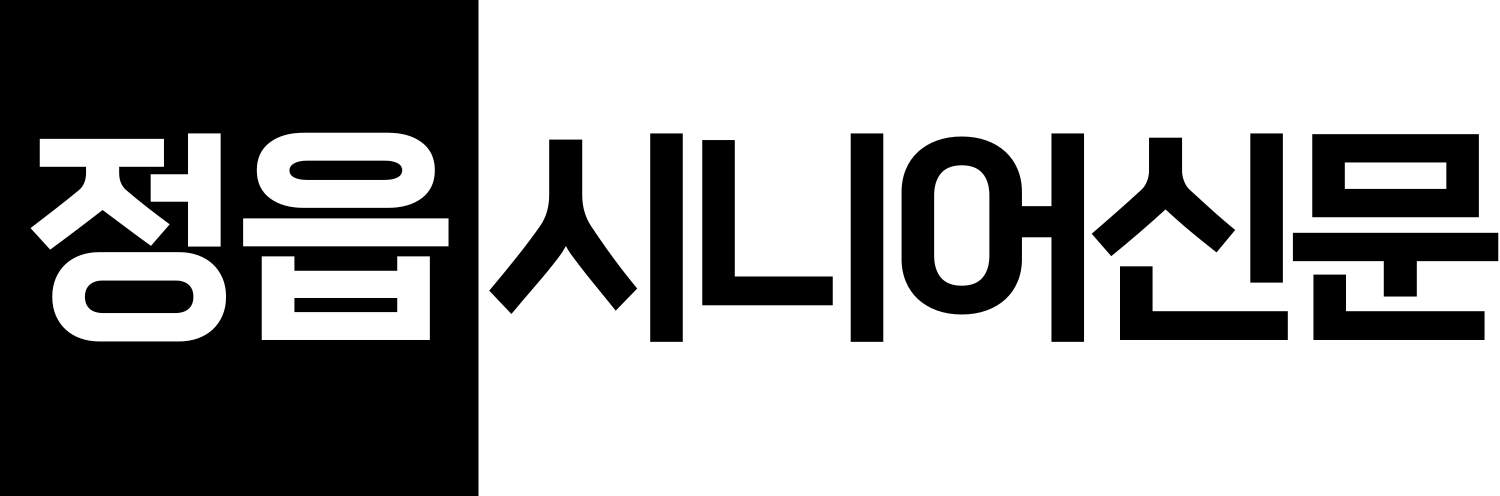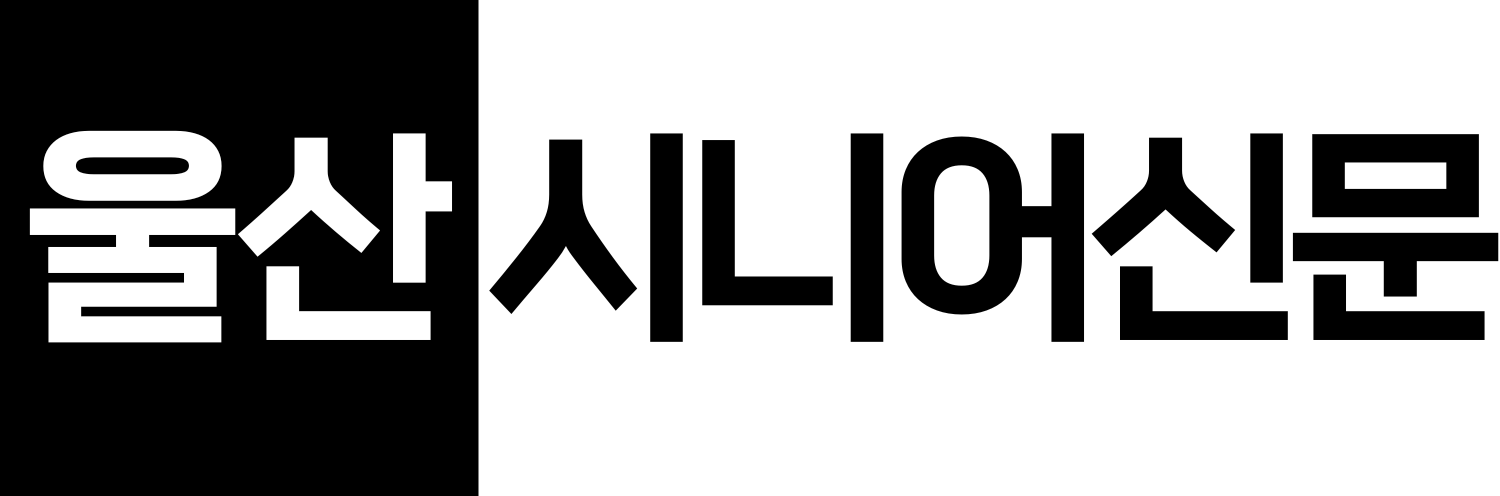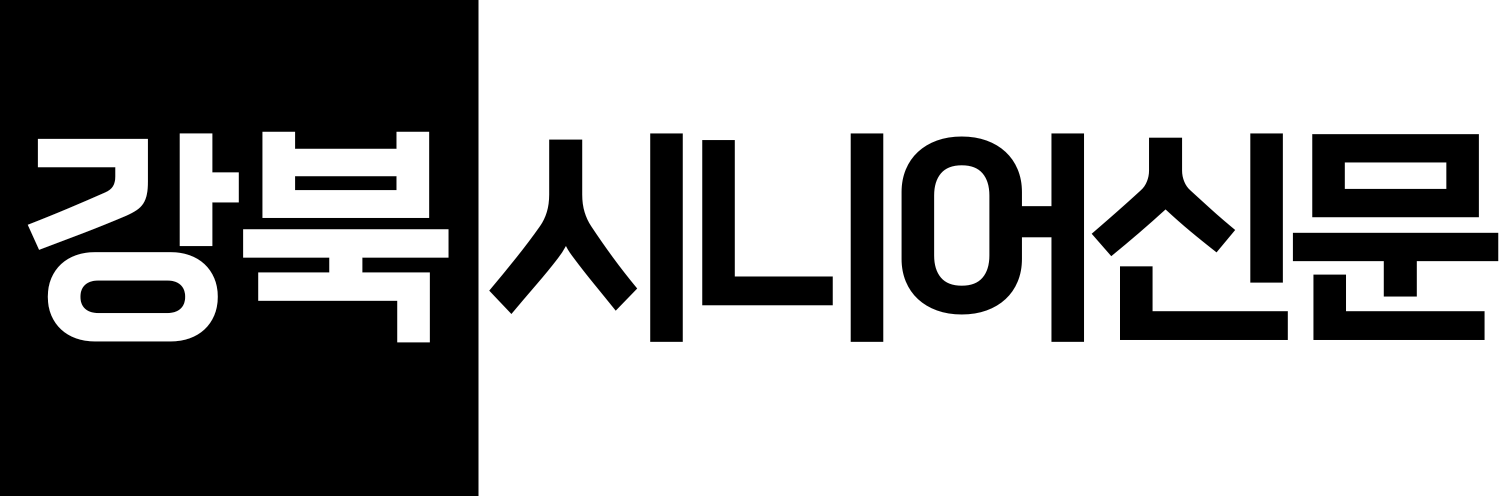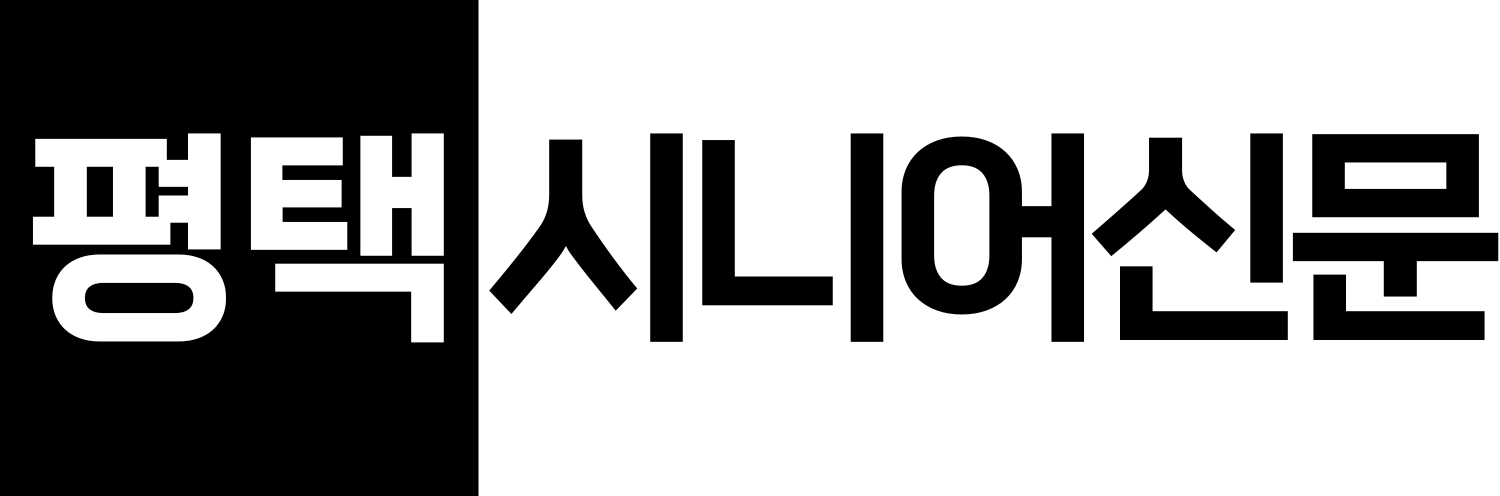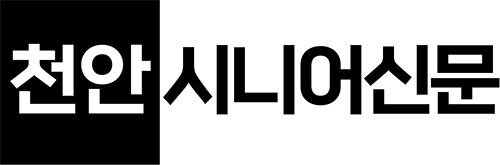대한민국이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공식적으로 넘었다. 이는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로,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부양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 속에서, 1000만 노인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은 눈덩이…’성장 엔진’이 멈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는 경제 분야다.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는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 비용이다. 1000만 고령인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고갈 위기에 직면했으며, 미래 세대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의료·돌봄 수요 폭발…’사회적 부양’ 시스템 한계 봉착
고령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의 폭발로 이어진다. 1000만 명을 넘어선 고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 역시 급증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의료 자원과 인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노인 부양의 기능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약화되면서, 이제 ‘사회적 돌봄’은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의 요양 병원이나 시설, 재가 서비스 인프라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기 속 기회…’실버 이코노미’가 새 성장 동력 될까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창은 열리고 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고령층은 그 자체로 막강한 구매력을 지닌 소비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 건강기능식품, 여가, 금융, 자산관리 등 이른바 ‘실버 이코노미’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테크 산업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맞춰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재편하는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세대 공존의 새 패러다임 절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법적 기준인 65세는 과거의 유물일 뿐, 오늘날의 60~70대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따라서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고령층의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아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